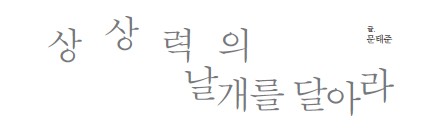
최근에 나는 조지훈 시인의 시 ‘범종’을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조지훈 시인처럼 종소리를 독특하게 상상한 예는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조지훈 시인은 아마도 “텡하니 비인 새벽”의 시간에 범종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무르익는 과실이/ 가지에서 절로 떨어지듯이 종소리는/ 허공에서 떨어진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종소리는 터져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다시 엉기고 맴돌아/ 귓가에 가슴 속에 메아리치며 종소리는/ 웅 웅 웅 웅 웅……/ 삼십삼천을 날아오른다.”
이 시를 통해 내가 놀란 것은 울려 퍼져나가는 범종의 소리 결을 낙하하는 과실의 운동에 견준 상상력 때문이다. 시인은 범종의 소리가 아주 잘 익었다고 썼다. 과육이 아주 잘 익어서 저절로 툭, 떨어지게 된 과실과도 같다고 썼다. 그러나 땅으로 떨어진 과실은 웬일인지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터지고 만 과실로부터 빛과 향기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다. 마치 파열처럼. 외부로 쏟아지면서 공중으로, 하늘로 날아오른다. 물론 빛과 향기의 쏟아짐은 종소리의 잔향을 빗대어 쓴 것이지만, 낙하한 과실의 어떤 속성이 다시 상방을 향해 솟아오른다는 상상력은 보통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시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달은 정말이지 많은 이들의 시심詩心을 탄생시켰고, 바퀴를 움직였고, 그 큰 수레에 실어 멀리 사라졌다.
이상교 시인은 동시 ‘오늘 밤 초승달’을 통해 달을 ‘손톱’으로 상상한다. “손톱이 그끄제보다/ 조금 더 자랐다// 저쯤 자란 걸/ 엄마가 본다면/ 자르자 했겠다// 초승달 손톱 밑에/ 때 끼었겠다”라고 썼다.
송찬호 시인은 시 ‘달은 추억의 반죽 덩어리’를 통해 달을 ‘밥’으로 상상한다. “누가 저기다 밥을 쏟아놓았을까 모락모락 밥집 위로 뜨는 희망처럼/ 늦은 저녁 밥상에 한 그릇씩 달을 띄우고 둘러앉을 때/ 달을 깨뜨리고 달 속에서 떠오르는 고소하고 노오란 달”이라고 썼다.
한편 젊은 시인 박성우는 시 ‘초승달’을 통해 달을 그리움의 몸이라고 상상한다. “어둠 돌돌 말아 청한 새우잠,// 누굴 못 잊어 야윈 등만 자꾸 움츠리나// 욱신거려 견딜 수 없었겠지/ 오므렸던 그리움의 꼬리 퉁기면/ 어둠 속으로 튀어나가는 물별들,// 더러는 베개에 떨어져 젖네”라고 써서 초승달이 보여주는 빛의 외형을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모로 누워 뒤척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는 희미하게 뜬 낮달을 올려보고, 캄캄한 밤에는 선명하고도 깨끗하게 떠서 멀리 가는 달을 올려보지만 그 달을 통해 상상하는 내용은 확연하게 다르다. 위에 소개한 것처럼 아이의 자란 손톱을 상상할 수도 있고, 밥을 상상할 수도 있고, 새우잠을 자는 연인의 마음을 상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내용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
가령 달을 통해 우리는 한 알의 탱자를 상상할 수도 있고, 처마에 켠 알전구를 상상할 수도 있고, 다 사용한 후 휴지통에 구겨서 버린 티슈 혹은 파지를 상상할 수도 있고,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쥔 동전을 상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흰 이마를 상상할 수도 있고, 목에 걸어준 둥근 화환을 상상할 수도 있고, 입맛이 쓴 환자를 위해 끓인 흰 죽을 상상할 수도 있고, 흰 돛을 올려 먼 바다로 미끄러져 가는 한 척의 배를 상상할 수도 있고, 네일샵에서 잘 다듬은 손톱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다. 상상력은 대양大洋과도 같으므로. 고래가 대양을 상상하듯이, 청년이 대양을 상상하듯이 상상할 수 있다. 한 톨의 씨앗이 높은 하늘과 가을의 끝을 상상하듯이 상상할 수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책 『꿈꿀 권리』에서 이렇게 썼다. “‘움직이는 물은 그 물 속에 꽃의 두근거림을 지니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한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냇물 전체가 술렁대는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상상력인가. 물과 꽃이 절묘하게 연결되는 이 생각의 율동을 보라.
상상력의 사다리를 놓을 일이다. 달까지 올라가는 긴 사다리를. 바람과도 같은 사다리를. 흐르는 물 같은 사다리를. 예측불허의 사다리를. 탄력이 좋은 사다리를. 우연하게 처음 만든 사다리를. 되돌아오지 않고 전진하는 사다리를.
문태준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등이 있다.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 동서문학상, 서정시학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불교방송 PD로 재직하고 있다.
ⓒ월간 불광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불광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