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그늘에 살며 생각하며 | 글. 남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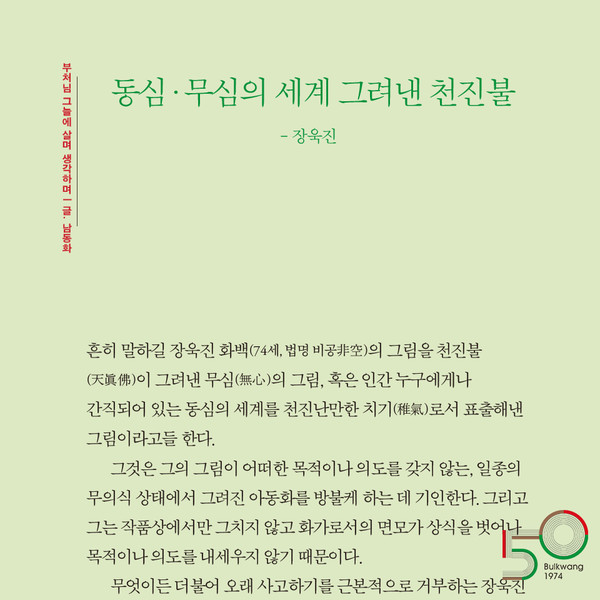
동심·무심의 세계 그려낸 천진불
흔히 말하길 장욱진 화백(74세, 법명 비공非空)의 그림을 천진불(天眞佛)이 그려낸 무심(無心)의 그림, 혹은 인간 누구에게나 간직되어 있는 동심의 세계를 천진난만한 치기(稚氣)로서 표출해낸 그림이라고들 한다.
그것은 그의 그림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지 않는, 일종의 무의식 상태에서 그려진 아동화를 방불케 하는 데 기인한다. 그리고 그는 작품상에서만 그치지 않고 화가로서의 면모가 상식을 벗어나 목적이나 의도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더불어 오래 사고하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장욱진 화백은 직관을 철저히 믿는다. 자신을 한 곳에 몰아세워 놓고 감각을 다스려 정신을 집중, 철저하게 사물을 보고, 철저하게 작업을 하고, 철저한 자유를 누린다.
“예술을 진작시키는 창작활동은 서투른 타협 없이 죽음과 친근해져 스스로 발랄하게 피어나는 꽃으로서의 열매 과정이며, 만인을 영원히 황홀케 하는 수없는 꽃의 씨앗을 심는 아릿한 연민이 스며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출가 수행자들의 구도행과 같은 것이기도 해요.”
장욱진 화백의 예술 근간을 젊은 시절 두 개의 체험에서 보는 이도 있다. 하나는 그가 고보 시절(당시 17세) 예산 수덕사의 만공선사 아래서 수양을 받았다는 사실과 해방 후 한 시기를 박물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에서 보는 것이다.
고보시절 전염병인 성홍열을 앓게 되고, 이 열병의 후유증을 다스리기 위해 고모와 인연이 깊던 만공 스님이 계신 수덕사에서 정양하던 중 만공 스님은 “머리를 깎여 불자(佛子)로 만들고 싶다. 하지만 네가 하는 공부나 우리가 하는 공부(禪)나 모두 같은 길이라”고 하시며 “마누라를 잘 얻으면 재미있게 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백성욱 박사와의 깊은 인연으로 함께 시골의 사찰을 자주 찾았으며, 그런 인연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와 <사찰>을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백성욱 박사님의 말씀대로 원을 세워 공부방(경전을 읽는 독경방으로 가회동과 현재 살고 있는 용인에 지음)을 지었다.
그리고 1977년 여름에는 양산 통도사에 가서 삼소굴에 칩거 중인 경봉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장욱진 화백은 곧바로 “까치 그리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실지로 그의 그림에는 까치가 많이 등장하며, 어렸을 때부터 까치를 많이 그렸다). 그러자 “웃는 꽃도 그리고 노래하는 새도 그려야지” 하며 “입산을 했더라면 진짜 도꾼이 됐을 텐데…. 그러나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명이 있느냐고 물으시고는 없다고 하자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면 모든 진리를 자유롭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데서 부처의 모습을 본다(無我無人 觀自在. 非空非色 見如來)”라는 구절이 든 선시(禪詩)를 지은 뒤 비공(非空)이라는 법명을 주셨다.
이를 인연으로 수안보의 뒷동네인 탑동에 자리 잡은 그의 화실의 이름을 경봉 스님이 지어준 선시의 구절을 빌려 관자득재(觀自得齋)라 당호(堂號)를 짓기도 했다.
장욱진 화백은 불경 한 구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의 부인 진진묘(眞眞妙) 보살(본명은 이순경 씨로 이병도 박사의 맏딸이며, 장욱진 화백이 그림을 시작한 것과 자신이 『금강경』을 독경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동시였다고 말한다)이 그렇게 이르듯 전생에 불연(佛緣)이 많은 분인 듯 그의 그림은 불교적인 색채가 짙다.
화가는 자기에 맞는 재료와 소재를 끌어들여야지 거기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보는 장욱진 화백은 유화니 수채화니 구분해 가면 그만큼 좁혀지는 것이라 보며,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운용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테레핀(물감 농도를 조절하는 오일)이 없으면 석유로, 캔버스가 없으면 종이나 벽이나 강가에서 주워온 조약돌에 상관없이 그림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그의 삶도 어느 한 곳에 천착되지 않고 자유스러우며, 일반 상식을 초극(그래서 그를 일반 세인들은 기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직관에 의해서 얻어진 단순하면서 명쾌한 형태로 오히려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까치·강아지·아이들·나무·달·새·초가집·소·닭·기러기 등. 같은 것이라도 친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 속에 동화(同化)된다고 말하는 장욱진 화백의 일관된 그림의 소재는 일상적인 자연이다.
두두물물(頭頭物物) 어느것 하나 부처 아닌 것이 없듯 그는 일상 만물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보고 그것과 완전히 하나된 경지에서 그 물상(物相)들을 함축적인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장욱진 화백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런 것 없다며 그림 그리는 일 말고 달리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한다. 창작활동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언제 보나 순진무구하고 그림 이외는 완전 무능해서 두 손에서 붓만 빼앗으면 그 자리에 앉은 채 빳빳하게 굶어 죽을 사람 같다”고 지적한 그의 친구의 말대로 용인군 마북리에서 본 장욱진 화백은 우리의 눈에도 세세생생 타고난 예술가로 비쳤다.

1990년 5월호(통권 187호)에 실린 남동화 기자의 장욱진(張旭鎭, 1917~1990) 화백의 인터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