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은 눈을 보지 못한다(안불견안眼不見眼). 시선은 항상 타자나 바깥의 사물을 향해 있기 마련이다. 시선을 향하고 있는 주체인 ‘나’를 보게 하는 대표적인 매개물은 반사체인 거울이다. 그 거울에서 자신의 젊음과 늙음, 미와 추를 보고 차림새 등을 살핀다. 거울은 때로는 감탄을, 때로는 탄식을 자아내며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내면의 성찰을 이끌어 내는 도구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진 나르시스. 그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물속의 또 다른 자신의 무심함에 상심해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신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불교 경전인 『능엄경』에도 전한다.
실라성(室羅城)에 연야달다(演若達多)라는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의 눈과 눈썹을 좋아하다가 정작 자기 머리에서는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자 스스로를 도깨비라고 여기며 분노해 미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비유를 들어 부처님은 ‘미혹의 원인은 미혹 자체에 있을 뿐이며, 미혹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없앨 망상도 없으니, 곧장 광기를 그치기만 하면 머리를 자기 밖에서 구하는 어리석음 따위는 범하지 않으리라’라고 했다.
또 『백유경(百喻經)』에서는 많은 빚을 지고 도망가던 가난한 사람이 우연히 보물 상자를 발견했으나, 그 보물 위에 놓여 있던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는 보물 상자의 진짜 주인인 줄 알고는 깜짝 놀라 보물을 버리고 간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아我)라는 것이 있다고 망령되이 집착하며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잡비유경(雜譬喻經)』에는 부부가 술독 안의 포도주에 비친 각자의 모습을 보고 서로 다른 여자와 남자를 숨겨 두고 있다고 여겨 싸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모습을 본 한 도인이 ‘어리석게도 공(空)을 실(實)이라 여기는구나’라며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다 술독을 깨뜨려, 술독에 비쳤던 상이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우쳐 줬다.
이처럼 거울이나 물은 자아를 확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고 집착할 만한 실체로서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음(무아無我)을 환기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
선(禪)에서는 거울을 ‘한 점의 흐림도 없이 맑다’는 뜻에서 ‘명경(明鏡)’이라 하고, ‘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 무엇이나 차별 없이 비춘다’는 뜻에서 ‘고경(古鏡)’이라고도 한다. 고(古)는 단지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고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뜻을 내포한다. 또한 ‘귀경(龜鏡)’이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에서 거북의 등을 불에 태워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쳤던 것처럼, 거울이 사물의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등을 구분 짓고 사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한편으로는 보배와 같다 해서 ‘보경(寶鏡)’ 또는 ‘보감(寶鑑)’이라고도 한다. 감(鑑)은 경(鏡)과 같은 말이나, 모범 또는 교훈이 될 만한 것으로 ‘거울삼을 만하다’는 함의가 더 짙다. 인천보감(人天寶鑑)·명심보감(明心寶鑑)·선가귀감(禪家龜鑑) 등이 그 예다.
거울을 한자로 풀어 보면 잡다하게 뒤섞인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꾸밈새가 없고(순淳), 조금의 더러움도 없이 깨끗하며(정淨), 대단히 맑게 빛나 밝다(명明)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거울의 근본 기능은 대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데에 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어구가 ‘호인(胡人)이 오면 호인을 비추고 한인(漢人)이 오면 한인을 비춘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호인(胡人)은 한족(漢族)이 아닌 이민족을 지칭한다. 한족이니 이민족이니 하는 분별은 사람들 의식의 산물일 뿐이며 거울과는 무관하다. 중국 당나라의 천동정각(天童正覺)선사는 거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거울은 대상 비춤에 한쪽으로 치우침 없고
쟁반에 놓인 구슬은 저절로 구른다네.”
송나라의 원오극근(圜悟克勤)선사 역시 “종은 치는 대로 울리고 계곡은 소리 따라 메아리치며, 못은 달 그대로 새기고 거울은 형상 그대로 드러내네”라고 읊었다. 이처럼 거울은 존비귀천(尊卑貴賤)이나 시비선악(是非善惡) 등을 가려 비추지 않는다. 거울의 이러한 속성과 기능은 선(禪)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본성은 거울의 빛과 같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곧바로 환히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선가귀감』 중에서
이같이 선에서는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나 불성(佛性) 혹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본래 성품은 거울과 같고 진심(眞心)은 거울의 빛과 같아, 빛은 거울을 떠나지 않고 거울은 빛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성인은 무심(無心)하게 사물을 대하니 오고 감에 물드는 일이 없지만, 중생은 무엇인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유소득심有所得心)에 사로잡혀 사물을 대하는 까닭에 분별하여 취사한다. 본체는 하나임에도 마음에 오염과 청정(染淨)의 차이가 빚어지는 것일 뿐이다.

신수(神秀)와 혜능(慧能)의 거울
마음을 상징하는 거울은 자연스럽게 수행과 연결된다. ‘이를 어떻게 갈고 닦으며 간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에 떠올랐고, 신수(神秀, 606~706)와 혜능(慧能, 638~713) 스님 논쟁의 서막이 오른다.
달마대사를 1조로 이어져 온 중국 선종은 5조 홍인(弘忍)에까지 이르렀다. 홍인은 법을 이을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게송을 지어내라 했는데, 그 문하 700여 제자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는 중에 상좌 신수가 이렇게 제출한다.
“몸은 깨달음 심는 터전이요,
마음은 맑은 거울 받침대라네.
언제나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일지 않게 해야 하리.”
신수의 글이 본성의 참뜻을 담아내지 못한 게송임을 알아본 혜능은 이렇게 읊었다.
“깨달음 심을 터전이란 본래 없으며,
맑은 거울 받칠 경대도 없노라.
본래 하나의 그 무엇도 없거늘,
어디에서 먼지 일리오!”
혜능은 한낱 방아나 찧고 있던 행자였지만, 홍인은 혜능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이 읊은 게송은 이후 돈점(頓漸) 논쟁의 불씨가 됐다. 단계적으로 순서를 밟아 가는 신수의 점수(漸修)보다, ‘어떠한 방편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 곳곳에서 곧장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혜능의 돈오(頓悟)가 우위를 점하게 된 극적 장면으로 남게 됐다.
신수가 깨달음의 주체와 그 대상을 양분해 놓았다면, 혜능은 ‘나무처럼 의지할 깨달음이라는 실체도 없고, 거울을 받칠 높은 받침대도 없으며 거울로 비출 대상도 없다’고 봤다. 혜능에게 마음이라는 거울은 처음부터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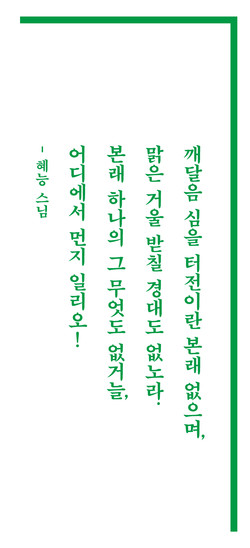
‘거울’을 화두로 삼다
① 형상이 변화한 후에 거울의 속성은 어디로 가나?
거울은 주장자(拄杖子)나 불자(拂子)처럼 선문답에서 공부 거리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선사에게 한 학인이 물었다.
“구리거울을 녹여 다른 형상을 만들 경우, (다른) 형상이 이루어진 후에 거울의 밝게 비추는 속성은 어디로 갑니까?”
“그대가 동자(童子)였을 때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학인이 물었다.
“형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무엇 때문에 비추지 않습니까?”
“비록 비추지는 않지만 조금도 속이지 못한다.”
남악회양은 명칭과 모양(名相)에 사로잡혀 거울의 밝음에 집착하는 학인의 분별을 어떻게 깨뜨려 주고 있는가? 그의 답에 담긴 뜻은 “무엇을 거울이라 할 것이며, 무엇을 형상이라 할 것이냐”는 말로서, 거울 그대로가 형상이고 형상이 곧 거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거울을 떠나 따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연화합(因緣和合)으로 이뤄진 것일 뿐 독립적 실체를 갖지 않은 ‘가유(假有)의 상’일 뿐이다. 동시에 거울은 거울대로, 형상은 형상대로 자신의 본바탕(기機)과 작용(용用)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이 마지막에 ‘조금도 속이지 못한다’라는 말에 담긴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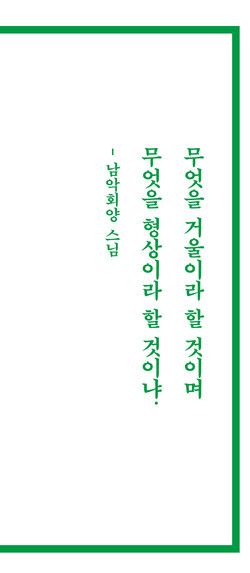
② 이것은 누구의 거울인가?
위산영우(潙山靈祐, 771~853)가 앙산혜적(仰山慧寂, 807~883)에게 편지를 부치면서, ‘거울 하나(일면고경一面古鏡)’를 같이 보냈다. 그러자 앙산이 거울을 들고서는
“이것은 위산의 거울인가,
앙산의 거울인가?
위산의 것이라고 하자니 앙산의
손안에 들려 있고,
앙산의 것이라고 하자니
위산이 보내 준 것이 아니던가!
제대로 대답하면 남겨 두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때려 부수겠다.”
대중이 대답이 없자 앙산은 거울을 던져 부숴 버렸다. 여기서 거울은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상징한다. 앙산은 위산의 법을 이은 제자로 이들을 종조(宗祖)로 하는 위앙종(潙仰宗)이라는 선종의 종파도 있다. 그 가풍은 자애로워 효성스러운 부자지간에 비유된다.
이런 관계에서 앙산의 물음을 “위앙종의 가풍은 위산의 본래면목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앙산의 것인가?”라고 바꿔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열려 있다. 어느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위산의 것이기도 하고 앙산의 것이기도 하다고 해도, 혹은 둘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러저러한 온갖 분별을 깨뜨릴 수단으로서 던진 ‘의문’일 뿐이지 확정된 답을 요구하는 물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앙산은 왜 거울을 부쉈을까?”라는 물음도 문답을 궁구하는 핵심 요소며, 화두 공부의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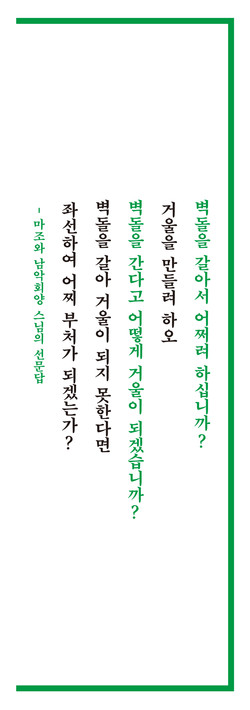
③ 고경(古鏡)을 갈고 닦는 전후는 어떠한가?
거울을 수행의 비유로 삼아 나눈 문답을 보자. 국태원도(國泰院瑫)는 “고경(古鏡)을 갈고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 “갈고 닦은 후에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도 모두 “고경이다”라고 답한다.
이에 반해 광교귀성(廣教歸省)은 “고경을 닦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닦아서 무엇 하려는가?”라고 한다. “닦은 후에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답한다.
원도는 수행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환기해 준 것이다. 귀성 스님은 수행을 통해 얻을 것도 없고(무소득無所得), 깨달을 것도 없는(무소오無所悟) ‘궁극에는 공(畢竟空)’인 이치를 드러냈다.
이러한 태도는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의 선문답의 취지와 비슷하다. 좌선(坐禪)을 통해 부처가 되고자 했던 마조 스님에게 남악회양은 벽돌을 갈아 보인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깨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추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 주지만, 동시에 ‘바라보는 나’와 ‘거울 속의 나’를 분리하고 왜곡하는 작용도 한다. ‘듣고 보고 느끼고 앎이 하나로 같은 것이 아니니, 산하는 거울 속 비친 모습에 달려 있지 않네’라는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의 게송 구절이 있다.
보고 듣는 색과 소리가 장애가 되어 막히기에 거울에 비친 모습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거울을 통해 보고서야 안다면 거울이라는 의지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주관과 객관(능소能所)’, ‘마음과 대상 경계(심경心境)’ 등으로 양분(兩段)되고 만다. 설두의 게송은 다음의 선문답을 참고해야 한다.
육긍(陸亘)이라는 사대부가 남전보원(南泉普願)에게 말했다.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이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고 한 승조(僧肇) 법사의 이 말은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전이 뜰 앞의 꽃을 가리키며 “대부여! 요즘 사람들은 한 그루 꽃을 보고도 꽃을 꽃으로 보지 못하고 꿈과 같다고 여긴다”라 답한다.
육긍은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는 말을 거울로 삼았다. 여기에 남전은 육긍이 의지하고 있던 관념의 뿌리를 뽑고자 했다. 만물일체(萬物一體)라는 승조의 말에 매달린다면, 꽃을 보고서는 “모든 유위법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번갯불과 같다”라는 『금강경』의 교설(敎說)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해 준 것이다.
남전의 마지막 말은 꽃은 꽃일 뿐이니, 꽃을 거울에 비춰 대상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벽암록(碧巖錄)』에서는 이를 “다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존재하는 모든 법이 각각의 자리에 머물고 세간의 차별상도 항상 머무른다”라고 풀었다. 동일성과 평등성에 대한 집착을 모든 존재 각각의 차별성을 부각해 남전이 깨뜨려 줬다는 풀이다.
거울에 불성이니 마음이니 하는 가치가 부여되고 그것을 전범(典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선에서는 깨뜨려야 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전락한다. “거울을 깨뜨린 다음에 (그대와) 만나 보겠다”라는 상용구에 담긴 뜻이다.
거울처럼 본보기로 비추는 법도나 격식(格)을 깨뜨려야 ‘얻을 것이 있다’라거나 ‘깨달을 무엇이 있다’라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져, 어디에도 머무르려 하지 않으면서도 어디에서나 머무를 수 있게 된다. 깨뜨리지 않으면 세울 수 없듯이(불파불립不破不立), 선에서 거울은 깨뜨리지 않으면 비추는 기능도 잃고 마는(불파부조不破不照) 역설적 상징물이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란 것도 결국엔 상호 간의 ‘비춤’이다. 상대의 웃음에 나도 모르는 결에 따라 웃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희로애락이라는 감정뿐 아니라 사소한 몸짓, 사유, 가치관도 전염돼 ‘투사’되거나 혹은 부정되어 ‘반사’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타자의 시선을 받고 살며 나의 시선 또한 타자에게로 향해 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자란 ‘나를 바라보는 자’이다. 나의 거울인 셈이다. 역으로 나 또한 타자에게는 거울이 된다.
하지만 타자 역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결정지어진 상(相)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에 대한 의식, 타자를 바라보는 나의 고정된 시선들이 모두 장애 요소가 되곤 한다. 이를 깨뜨리고 무심하게 비출 때 나와 너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듯하고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듯한’ 바로 그 소식 속에서 말이다.
나귀는 우물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고, 우물도 나귀를 굳이 비칠 마음이 없지만 서로 거울이 되는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다.
조영미
성균관대 한문학과, 서강대 국문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